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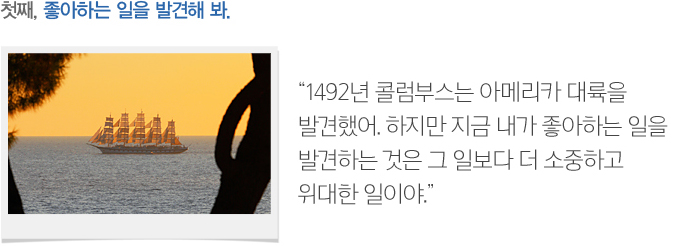
흔히 대학에 진학한 후 겪게 되는 고민 중 일 순위는 아마도 자신의 전공이 자기의 취향이나 성격과 별반 맞지 않는다는 점일 게다. 정말 미친 듯이 좋아서 지금의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몇이나 되겠니. 대개의 경우 그저 점수에 맞춰서 가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엉뚱한 전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예나 지금이나 적지 않단다. 설사 이전부터 관심 갖고 기대하며 선택한 전공일지라도 막상 부딪혀 보고 나서 실망하는 경우도 허다하지. 그래서 복수전공이다 뭐다 해서 호들갑도 떨어보고 급기야는 아예 새 전공을 찾아 유학을 가거나 심지어 다시 재수해 시험을 보는 경우도 없지 않잖니. 하지만 진짜 관건은 전공이나 과(科)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지!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한다는 것은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소중하고 위대한 일인지 몰라. 그만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사실 좋아하는 일을 발견한다는 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열정’의 문제란다. 가령,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고 말할 순 있지만 그것이 그저 취향의 수준이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다. 그러나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 정도가 약간 ‘미친 수준’이라면 얘기는 달라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피를 좋아해. 하지만 그렇다고 스타벅스를 만든 하워드 슐츠처럼 하지는 않아. 그는 커피에 미쳐서 직접 원두를 구하러 온 세계를 누비고 다녔고 마침내는 시애틀의 조그만 구멍가게 수준이었던 스타벅스를 세계적 기업으로 일궈냈단다. 좋아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미치는 거야. 열정을 갖고 몰입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이지. 그것을 발견하냐 못하냐가 결국 인생을 좌우한단다.
자기가 좋아서 미치는 일을 발견하려면 저질러봐야 해. 콜럼부스가 먼 바다로 나가지 않고 해안선에서 ‘깔짝거렸다’면 신대륙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저지르지 않고 머릿속으로 아무리 굴려봤자 소용없단다. 진짜 좋아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저지르고 해봐야 알아. 겉으로 보기엔 근사해 보여도 막상 해보면 금새 싫증나는 일들이 있지. 그건 진짜 좋아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 정말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려면 시도해보고 또 저질러봐야 해. 그리고 그것과 뒤엉켜 지내봐야 하지. 금새 싫증 내지 않고 그것 없이는 못살 것 같은 일. 그 일을 찾아. 그러면 그것이 너의 신대륙이야.

좋아하는 일을 발견했다고 인생의 돛대가 곧장 활짝 펼쳐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 그 좋아하는 일을 잘해야 해. 잘하지 못하면 속된 말로 ‘말짱 황’이야. 그렇다면 도대체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요즘은 ‘슈퍼스타K’를 뽑듯 온통 서바이벌 게임이야. 마치 절대지존만이 생존하고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정작 현실세계에서는 꼭 그렇지 않아. 절대적으로 잘한다는 것은 없어. 차이를 내면 잘하는 거야. 예전에는 점수 차이가 모든 차이를 대신했지. 하지만 이제 차이는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느낌과 감성 그리고 감동’의 문제야. 어떤 느낌이나 뉘앙스가 차이를 규정해. 그 사람만의 감성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감동이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만큼 가치가 부여되지.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곧 가치인 셈이야.
취직이 안 된다고 푸념하는 친구는 부모 탓, 학교 탓, 회사 탓, 사회 탓 하기 전에 스스로 차이를 만들지 못한 건 자기 탓이 아닌지 돌아봐야 해. 남들과 엇비슷한, 아니 똑같은 스펙만 가지고는 안돼. 그런 건 이제 다 엇비슷해서 더 이상 변별성 있는 평가의 기준도 못돼. 물론 문제는 엇비슷한 스펙을 가졌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가 하는 점이지. 누군가 내게 하소연하듯 말했어. “저는 면접에서만 내리 세 번 떨어졌는데요?” 나는 이렇게 답해줄 수밖에 없었지. “미안한 얘기지만 너는 차이를 만들지 못한 거야!”
그렇다고 면접 볼 때 무조건 튀라는 얘기가 아니야. 튀는 것은 차이가 아니잖아. 그냥 튀고 마는 것일 뿐이지. 튀는 것 가지고는 승부가 안나. 차이가 드러나야 해.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은 자기만의 ‘컬러’가 드러나고 더 나아가 자신만의 ‘느낌’이 풍겨나는 것이지. 그럼으로써 시쳇말로 ‘포스’가 다르게 다가오는 거야.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은 그 일에 자기만의 느낌과 색깔을 담아 상대로 하여금 아니 더 나아가 세상으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도록 만드는 힘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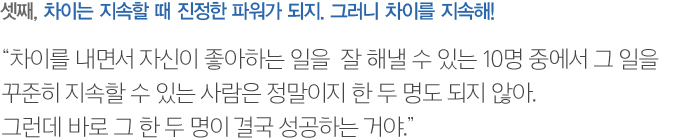
나는 등산을 좋아해. 그런데 산행을 하다 보면 한 발 한 발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새삼 알게 되지. 아무리 멀리 보이는 봉우리도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어느새 도달하게 되는 것이 등산의 마력이야. 이처럼 차이를 만들고 그것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무서운 힘이지. 너는 당장에 ‘점프하기’를 기대하겠지만 네가 마주하는 세상은 철저하리만큼 ‘온축(蘊蓄)’이야. 세상 만사 모두가 한 켜 한 켜 쌓아서 가는 것이지 결코 점프는 없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 꾸준히 지속한다는 것, 그것은 곧 힘이야. 그 어떤 힘보다 세고 강력하지. 그러니 지속의 힘을 잊어선 안돼.
결론적으로 여기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봐. 그들 100명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해. 하지만 그 100명 중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차이 내며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채 10명도 안돼. 그리고 그 10명 중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차이를 내면서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이지 한 둘에 불과해. 아니 그보다도 더 적을지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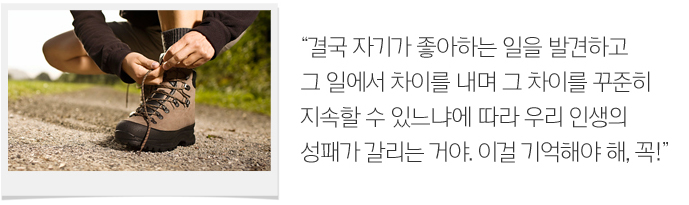
첫 편지가 좀 길고 딱딱했지? 하지만 너무 중요해서 어쩔 수 없었어. 물론 너에겐 그닥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테지만 ㅎㅎ... 다음에 다시 편지 할 때까지 잘 지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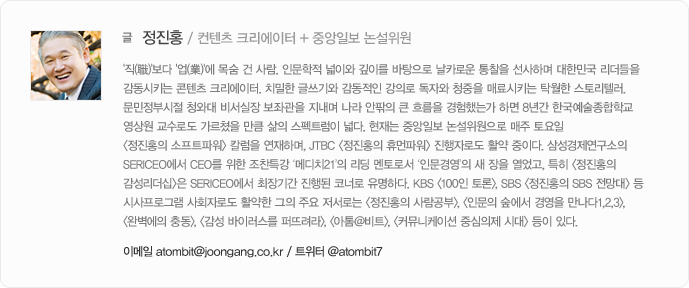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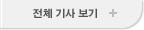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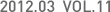

배너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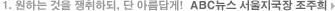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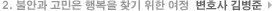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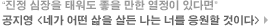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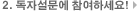



















 웹진 :
웹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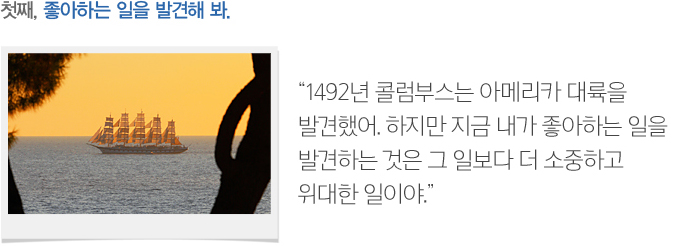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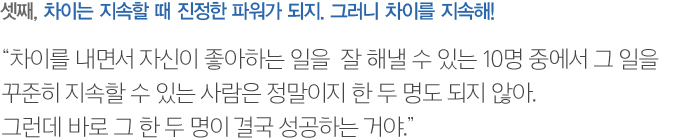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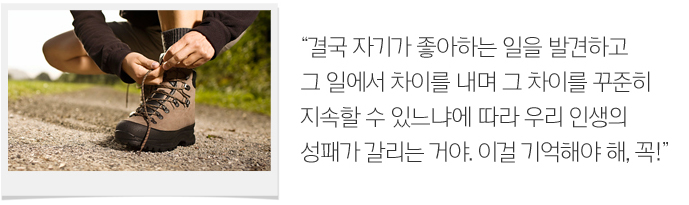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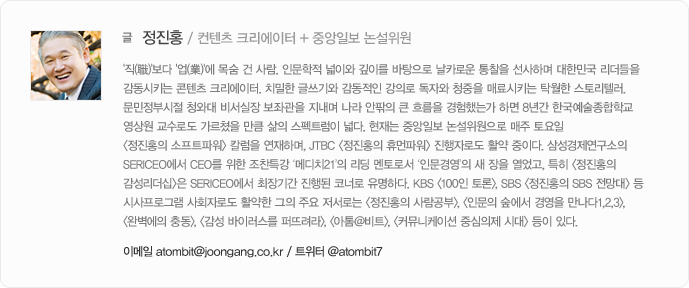

 웹진 :
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