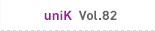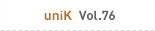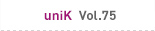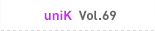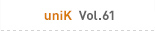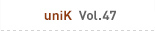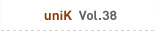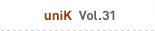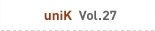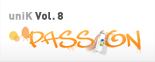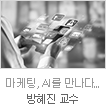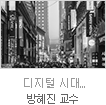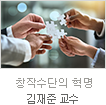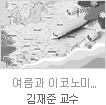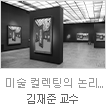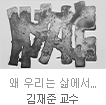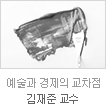KMU ECONOMY
창작수단의 혁명:
대량실업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제통상학과 김재준 교수)
『AI와 예술교육: 창조성을 창조한다』는 최근에 내가 쓴 책의 제목이다. AI가 인간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대체할 미래,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실업률 60% 시대가 온다면 대학의 모든 학과는 취업 전망에서 안전하지 않다. 구글에서 프로그래머를 해고하기 시작했으니, 오히려 철학과 인문학이 비전 있는 전공이 될 수도 있다. 중간관리자부터 최고경영진까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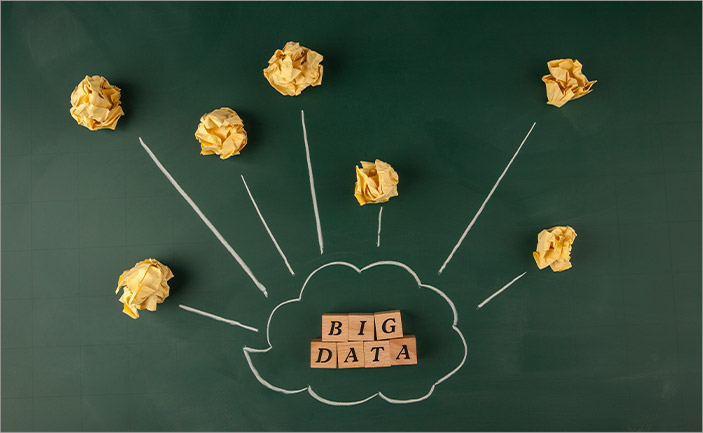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 희망을 발견한다. 과거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독점이 만든 불평등 체제였다. 소수가 공장과 기계를 소유하고, 다수는 노동력을 판매했다. 예술 역시 마찬가지였다. 기술적 숙련도라는 높은 장벽이 창작을 소수 예술가의 독점물로 만들었다. 화가는 데생과 색채를 익히는 데, 작곡가는 화성학과 대위법을 마스터하는 데 십 년이 걸렸다. 일반인에게 예술은 감상의 대상일 뿐, 창작은 꿈도 꿀 수 없는 영역이었다.
AI는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창작 수단의 독점이 무너지고 민주화되고 있는 것이다. 82세 할머니가 AI로 난생처음 그림을 그렸다는 일화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한다. “못 그려도 괜찮아요. AI가 도와주니까.” 이 한마디에 혁명이 담겨 있다. 평생 "나는 예술과는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마음속 풍경을 캔버스에 옮길 수 있게 되었다.
누텔라가 AI와 협업해 700만 개의 디자인을 만든 사례는 이 변화의 산업적 증거다. 과거라면 수많은 디자이너가 필요했을 일이다. 이제는 인간이 창의적 방향을 제시하고, AI가 무한한 변주를 생성한다. “인간이 지휘하고 AI가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 이것이 창작수단이 공유되는 새로운 생산 패러다임이다.
“AI가 당신의 일을 대신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넷플릭스나 보며 소파에 누워있을 건가요?” 답은 명확하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놀고먹을 수만은 없는 존재”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왜 이것을 만드는가?’라는 질문에는 오직 인간만이 답할 수 있다. 의미의 창조와 가치 정의, 이것이 AI 시대 인간의 역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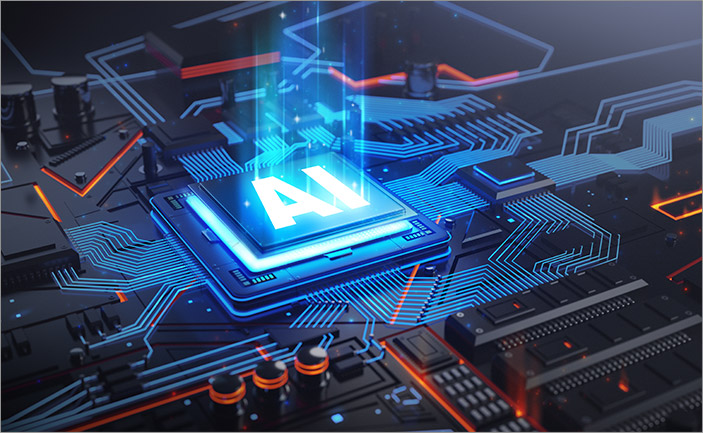
물론 새로운 도전도 있다. “예술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사람이 도태된다”는 경고는 새로운 격차를 예고한다. 과거의 불평등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였다면, 미래는 창작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상상력의 유무가 결정한다. 인스타그램에서 일상을 ‘큐레이션’하고, 데이트가 ‘경험 디자인’이 된 시대. 창의성은 이미 모든 직업의 필수 역량이 되었다.
“인류의 미래는 예술적인 미래,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라고 생각할 수 있다. BTS는 가수인가, 외교관인가, 비주얼 아티스트인가? 이미 경계는 무너졌다. CEO는 퍼포먼스 아티스트가 되고, 요리사는 미각 예술가가 된다. 모든 직업이 ‘예술화’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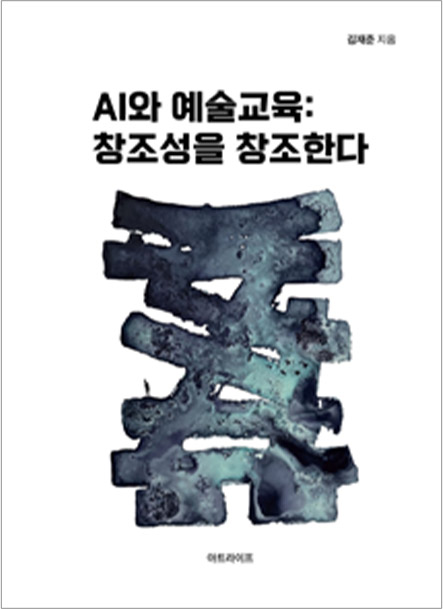
이제 계급은 자본이 아닌 상상력으로 나뉜다. 대량 실업은 재앙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창조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일지 모른다. “상상할 수 있다면, 당신도 예술가다.” 이것이 21세기 창작 민주화 혁명의 본질이다. 문제는 AI가 예술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AI 때문에 경제와 사회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국민대 박물관장과 도서관장을 역임하고, 화가·컬렉터·오디오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예술·인문학·수학·기술 등의 융합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AI와 미래 레지던시의 연구와 기획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