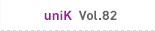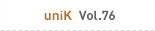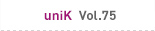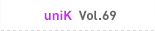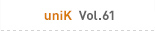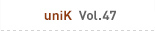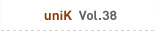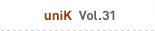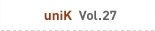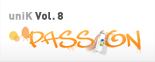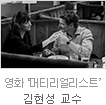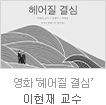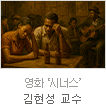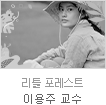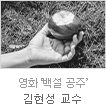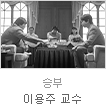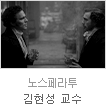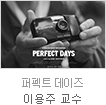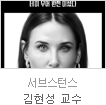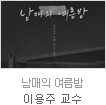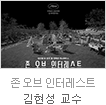KMU CINEMA
영화 ‘시너스’(SINNERS)
- 영화 속 ‘KEY’ -
(영화전공 김현성 교수)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최신작 ‘시너스’(SINNERS)가 미국 영화계를 강타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호기심을 자극했고, 한국에서는 별로 큰 흥행을 하지 못했지만, 제작사 측도 별로 큰 기대는 않았던 것 같다. 영화는 여러 개의 장르가 혼합된 작품이었고 사뭇 영리한 스토리 전개에 감독의 얕은수가 보이면서도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었다. 영화가 끝난 뒤 조용히 복기해 보았고 벰파이어와 같은 장르물을 섞었지만, 감독은 결국 흑인의 뿌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음악영화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었다.

1932년 미시시피 델타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흑인 음악인 ‘블루스’에 대한 오마주이자 영화의 주제로 삼았다. 1막은 흑인 역사와 종교 그리고 아픔을 음악으로 표현한 블루스를 소개한다. 1막은 자칫 지루할 수 있는데 주인공의 1인 2역의 연기와 영화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울트라 파나비전 70(Ultra Panavision 70mm)과 아이맥스(IMAX)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황홀함에 빠져서 지루할 틈을 못 느꼈다.
최근 할리우드도 극장 관객의 감소에 따라 관객을 다시 극장에 불러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영화 화면 비율(Aspect Ratio)의 변화이다. 안방-OTT에 관객을 뺏긴 지금은 TV가 1930년도에 처음 발명됐을 때의 극장 영화 위기보다 훨씬 더한데, 결국 거대한 화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관객의 ‘체험’(참가)에 사활을 건 듯하다.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가 말한 것처럼 영화도 언어처럼 랑그(Langue)와 파롤(Parole)로 이루어져 있다. 즉 내용이 랑그라면 영화 속 톤(Tone)과 키(Key)는 파롤이다. 감독은 블루스의 선율로 파롤의 힘을 보여준다. 음악처럼 인간의 마음을 곧바로 움직이고 감정의 진폭을 크게 느끼게 해주는 힘을 가진 매체는 없다. 그렇다면 왜 라이언 쿠글러는 광활한 IMAX와 울트라 파나비전 70에 블루스를 접목한 것일까?

감독은 화면 비율의 변화를 통해 비주얼 적인 ‘톤’과 ‘키’를 마치 음악의 ‘리듬’, ‘선율’, ‘화성’의 변주처럼 사용한다. 거대한 화면에서, 특히 ‘IMAX’에서 묘사된 자유로운 하늘을 바라보는 인간들을 통해 자유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보여주며 ‘울트라 파나비전 70’을 통해 다인종 간의 ‘관계’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표현한다.
즉, 음악(블루스)을 통해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감정을 눈으로도 듣고 느낄 수 있게 노력한다는 것이다. 흑인들의 피를 빨았던 백인 흡혈귀들의 이야기는 관객 서비스이고 제목 ‘시너스’는 과연 역사 속에서 누가 진정한 ‘죄인’인가를 질문한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다인종들의 초현실적인 축제 장면은 이 영화의 주제이며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만한 명장면이다.

미국영화연구소 AFI 석사를 졸업하고 2010년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영화전공 교수로 부임했다. 주요활동으로 ‘나비’, ‘비브레이커즈’ 등을 연출했으며, 2000년 미국 선댄스 영화제, 2003년 이탈리아 베니스국제영화제, 2014년 부천판타스틱 영화제 등에 초청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