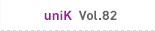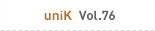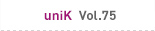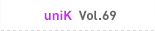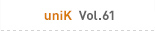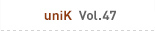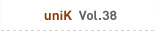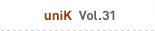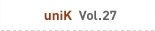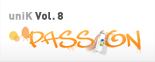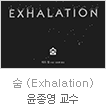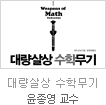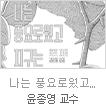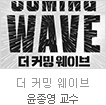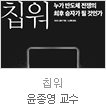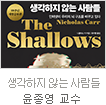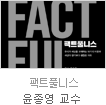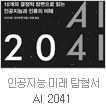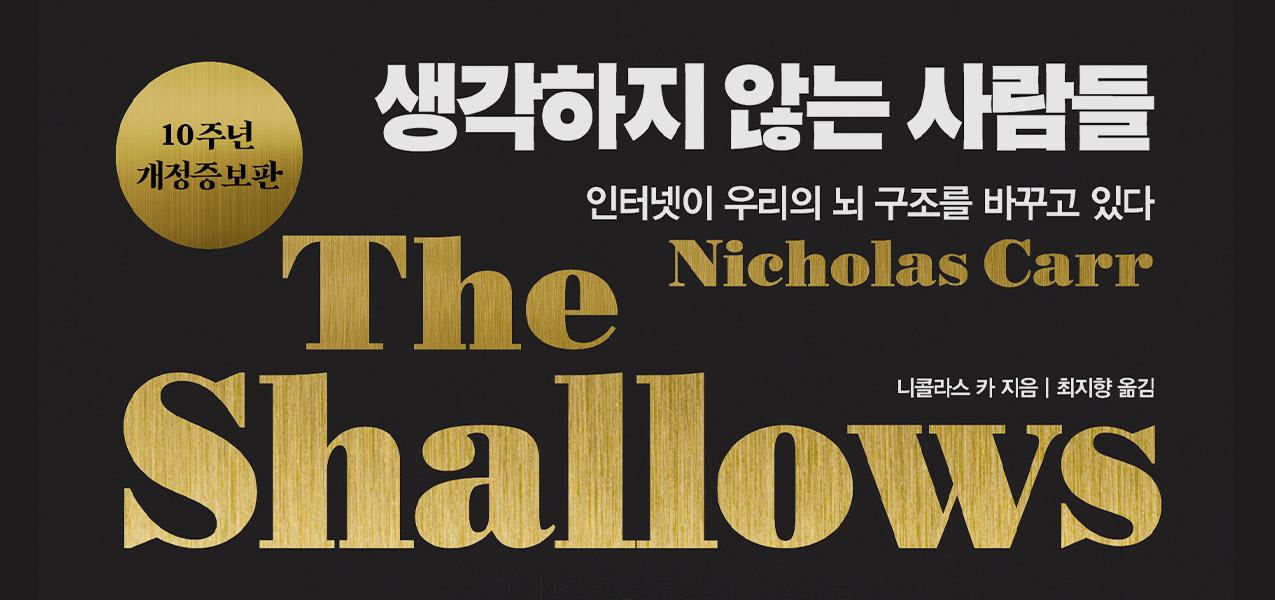
KMU BOOKS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The Shallows)”
-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
(소프트웨어학부 윤종영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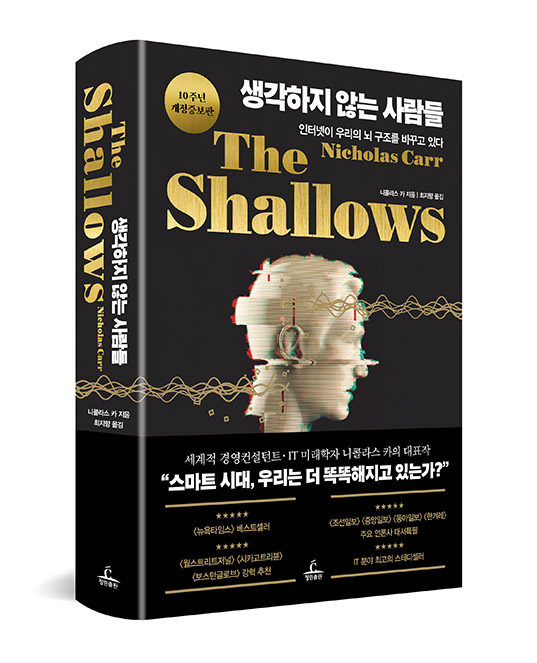
이번에 소개할 책은 니콜라스 카(Nicholas Carr)의 대표작,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The Shallows)』입니다. 이 책의 초판이 나온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디지털 환경이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일상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화된 요즘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당연한 시대,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책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또 어떤 통찰을 전해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인터넷이 우리의 사고 과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검색하고, 짧은 기사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올라온 글들을 대충 훑어보는 식으로 정보를 얻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하려면 전화를 걸기보다 메신저 앱을 사용하고, 긴 글이나 어려운 자료 대신 편집된 영상 요약본이나 이미지를 더 자주 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 상황이 편리하고 자연스럽다고 느끼실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활 패턴이 우리가 ‘깊이 읽고, 곱씹으며,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점점 잃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인터넷이 두뇌의 물리적 구조까지 변화시킨다”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며, 우리에게 ‘디지털 기술이 사고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근본적 물음을 던집니다.

이 책을 읽으면 흥미로운 뇌과학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바로 ‘뇌 가소성(plasticity)’입니다. 뇌는 우리가 무엇을 반복적으로 하고,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 그 연결망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과거에는 종이책을 꼼꼼히 읽으면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던 사고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짧고 단편화된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에 익숙해지는 바람에 우리의 인지 패턴 자체가 얕아지고 단순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현대인들이 긴 글을 참을성 있게 읽기보다는 끊임없이 링크를 타고, 이 창에서 저 창으로 이동하고, 알림에 반응하며 겉핥기식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결국 이 습관이 뇌에 깊이 박히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전하는 셈입니다.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가져온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가 ‘멀티태스킹’입니다. 한쪽 창으로는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창으로는 채팅을 하면서, 동시에 뉴스를 검색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쉽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자가 다양한 연구와 통계를 인용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실제로는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병행할 때, 우리는 의외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집중력이 분산되어 결국 실수나 피로도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나는 그래도 멀티태스킹에 능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이 책에서 또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사고의 과정’과 ‘기억’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특정 정보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그 정보를 반복하거나 연결 짓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방대한 정보 홍수 속에서는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작 우리 뇌가 그 정보를 길게 붙잡아 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중요한 건 언제든 검색하면 되는데 굳이 외우거나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사고방식이 싹트면서, 기억과 사고 체계 자체가 피상적으로 변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는, 스마트폰을 장착한 ‘외부 두뇌’를 사실상 늘 갖고 다니는 우리가, 뇌가 원래 가진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주장들에 대해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시대에 너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고, 세상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 주죠. 저자 역시 기술의 장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뇌가 ‘편리함’ 뒤에 숨은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기능을 잃어갈까 봐 경고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지적하는 문제점에 백퍼센트 공감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디지털 기술과 공존하며 뇌의 능력을 지킬 것인가?”라는 문제에 함께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얼마나 깊이 읽고, 생각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알람 하나에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들어 확인하고, 몇 줄짜리 요약본이나 밈(meme)만 봐도 내용을 다 안듯이 넘어가는 모습이 어쩌면 익숙하지 않나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울림은 “편리함과 풍부함 속에서도 왜 자꾸 생각이 얕아지고 있을까?”라는 문제를 직접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이미 요약해 놓은 정보와 영상을 빠르게 소비하느라, 정작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사유하는 과정’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죠.
한 권의 책으로 인생이 바뀌진 않겠지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할 때 얼마나 무의식적인지, 그리고 이를 바꿀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뇌과학적 근거와 사회문화적 분석을 설득력 있게 엮어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우리의 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를 보여 주기 때문에, 읽는 내내 충격과 공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다만 너무 비관적인 시각이 아닌지 생각해 볼 여지도 있기에,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누리면서 단점은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해서는 독자 각자가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편리함을 누릴수록 스스로 ‘깨어 있음’을 유지하는 태도, 즉 자신이 디지털 매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떻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활용할 것인가를 꾸준히 고민하는 자세겠죠. 지금 손에서 스마트폰을 떼지 못해 고민한다면, 혹은 디지털 시대의 정보 소비 방식에 대해 자각하고 싶다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 번 읽어 보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스탠포드대학교 석사를 졸업하고 2016년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 전공 교수로 부임했다. 주요활동으로 실리콘밸리의 다양한 기업에서 15년 넘게 IT아키텍트로 커리어를 쌓았으며, 국민대학교가 운영한 서울시 AI양재허브의 센터장을 역임했다.